하늘 돌에 새긴사랑

도학회/ 종문화사
서산 부석사 배경으로
의상·선묘낭자 이야기를
현대적 스토리로 재구성
“설화를 재생산하는 것은
문화에 다양성 입히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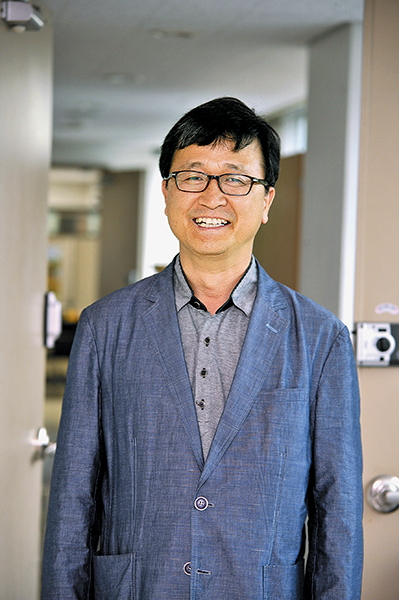
“부석사 이야기 좀 써주세요.” 조각가인 도학회 한서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스님에게 원고 청탁을 받았다. 미술사를 연구하다보니 상상력이 뛰어나면서 불교의 각종 유물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 주지 스님이 소위 부석사 스토리텔링을 의뢰한 것이다. 지난 5일 저자를 만나 소설 <하늘 돌에 새긴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각가는 작품의 예술성과 기능에 밝지만, 그 예술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번 소설을 쓰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며 문화유산을 답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도학회 교수는 ‘종 조각가’이면서 미술학자다. 그가 쓴 소설 <하늘돌에 새긴 사랑>은 서산 부석사를 배경으로 한국 스님과 중국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소설은 젊은 나이의 금정스님이 중국어학과에 입학해 중국인 유학생 유향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부석사 창건 설화인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승화한 것. 하지만 신비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상의 스님과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두 주인공은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다. 여인은 중국에 귀국해 성숙한 사회인으로, 스님은 더욱 철저한 수행자로 돌아간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수행자의 생활을 한발자국 떨어져 엿볼 수 있다.
도학회 작가는 “일상의 번민을 깨달음으로 끌고 가려는 금정스님의 모습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불교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금정스님을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부석사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석사에서 큰 스님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큰스님이 소설의 주인공 금정스님 같은 분이었으면 합니다. 범접하기 힘든 스님이 아니라 친구같고, 아버지 같은 스님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소설에 담았어요.”
이 소설의 독특한 부분은 조각과 건축 전문가인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이다. 밀납을 녹여 종을 만드는 과정을 비롯해 문화유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첨가해 독자들에게 문화유산을 보는 시야를 제공한다. 또 새로운 문화유산에 대한 저자의 시각도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을 조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듯 땅과 하늘 모두 동그랗습니다. 그렇다면 종을 조각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양식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문화유산을 창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설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소설에서 금정스님과 황 교수의 대화는 불교의 나갈 방향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둘은 문답을 통해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듯이 사물을 다양하게 바라봐야 한다. 일상 속에서 위대함을 찾아야 한다.” “일상에 분명 마왕 파순도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위대함을 찾고, 우리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파순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화를 나눈다.
소설은 다시 금정스님과 유향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졸업을 앞둔 금정스님은 자신을 이성으로 대하려는 유향에게 말한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는데, 수행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다만 스님들은 물욕에 빠지고 영혼이 왜곡돼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자기 속에 내재된 불성을 드러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20개월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도 교수에게 어떤 것이 좋은 종인지 물었다. 도 교수가 설명하는 좋은 종의 요건은 “오래 들을수록 좋은 소리를 가진 종”이다. “사람들에 따라 낮고 울림이 긴 종소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맑고 경쾌한 소리를 좋아하기도 해요. 원하는 소리가 다르죠. 하지만 결국은 다수가 오랫동안 들을 때 좋은 종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 같습니다.” 처음 소설을 쓸때 잠시 외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작 글을 쓰면서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게 됐다는 도 교수는 “기회가 되면 종 불사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제작과 종각에 걸기까지 전 과정을 글로 써 남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자 도학회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고구려 사신상전> <칠불전>등 10여 회의 개인전을 연 바 있다. 또 일본 후지 산케이 하코네박물관,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등에서 조각 관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논문으로 <한국 범종연구, 종두 디자인의 새로운 모색> 등이 있다.
[불교신문3113호/2015년6월17일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