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죽 끓여 나누고 향 피우며 새해 발복 기원

성도절에 나누는 납팔죽
“섣달초파일에 먹는 죽은 인도에서 전해졌지. 칠보의 미 어우러지고 오미의 향 깃들었네. 붓다의 부들자리에 이를 공양해 공덕 지으리.”
당나라 때 이복(李福)이 지은 <납팔죽(臘八粥)>이란 시이다. 6년 고행으로 쓰러진 부처님이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으로 기력을 얻어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그녀가 올린 공양의 공덕은 헤아릴 길이 없다. 이에 중국에서는 12월 8일 성도절에 유미죽을 상징하는 ‘납팔죽’을 먹으며, 부처님의 치열한 구도행과 깨달음을 새겨왔던 것이다.
납팔죽은 납월에 여덟 가지 재료로 만들어 먹는 죽이란 뜻이다. ‘납(臘)’은 ‘렵(獵)’과 통하는 말로, 고대로부터 그해 마지막 달에 사냥한 동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기에 음력12월을 납월(臘月)이라 한다. ‘팔(八)’은 성도절 날짜이자 중국인들이 길상의 의미로 즐겨 쓰는 숫자이기도 하다. ‘재물이 일어난다(發財)’는 뜻의 ‘발(發)’과 숫자 ‘8’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실제 납팔죽은 갖가지 곡식에 견과류ㆍ과일 등을 넣어 만드는 영양이 뛰어난 죽이다.
이날 사찰에서는 납팔죽을 쑤어 신도들은 물론 이웃과 나누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죽을 보시하며 부처님의 음덕을 중생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다. 이 풍습은 송나라 때부터 성행하여 “섣달초파일 큰절에서는 칠보오미죽을 끓여 신도들에게 보내는데 이를 납팔죽이라 한다. 장안에서도 과일과 잡곡을 섞어 죽을 끓여먹는다.”는 기록이 전한다. 부처님께 올린 수자타의 유미죽이 중국으로 건너와 하화중생의 천년세월을 이어온 셈이다.
민간에서도 죽을 끓여 신불께 올리는가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에 기대어 이날 금강역사로 분장한 마을사람들이 북을 치며 역질을 쫓아내었다. 나라에서는 신하들에게 죽을 내리는 한편 사찰에 쌀과 과일을 보내 납팔죽을 만들게 하였고, 스님들은 발우를 들고나가 탁발한 곡식으로 죽을 끓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백성들은 ‘부처님의 죽(佛粥)’이라 부르기를 즐겨하며, 이날 불죽을 먹어야 새해를 건강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납팔죽을 간편하게 팥죽으로 쒀서 나누는 사찰도 많아 동지와 성도절의 명절음식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사찰의 팥죽나누기는 어디까지나 동지의 절식이니, 우리에게 없는 ‘섣달초파일 납팔죽’은 불교명절에서 유래하여 민간에 확산된 부러운 절식이라 하겠다.

작은설과 섣달그믐 풍경들
강소성 양주의 전통마을에서는 음력 12월23일에 양주명물인 ‘세 가지 머리음식’ 삼두연(三頭宴)을 준비한다. 삼두는 돼지머리ㆍ생선머리ㆍ사자머리로, 두 가지는 실제 돼지와 생선을 쓰는 데 비해 사자머리는 돼지고기로 완자를 만들어 야채와 함께 끓인 탕을 말한다. 둥근 완자 모양이 사자머리를 닮았다고 여기며 ‘삼두’의 구색을 맞추는 셈이다. 바로 이날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모시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는 귀한 음식이다.
중국인들은 춘절(春節)을 일주일 앞둔 12월23일을 작은설, 소년(小年)이라 부른다. 이날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한 해의 집안일을 보고하면, 그 선악에 따라 화복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조(送)’라 하여 조왕신이 떠나는 날 밤에 맛있는 음식을 바치며 선처를 바라는 제사를 지낸다. 이때 당과를 반드시 올리는데 엿처럼 달달한 말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 입이 붙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두루 담겨 있다.
그런가하면 “납팔이 지나면 새해래요. 납팔죽을 며칠 먹노라면 금세 조왕님 하늘로 올려 보낼 날이 된대요.”라는 가요가 전한다. 새해는 섣달초파일부터 체감되어 작은설에 본격적인 새해맞이가 시작되는 셈이다. 납팔죽 또한 춘절까지 확대되어 송구와 영신을 아우르는 절식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예로부터 위세 있는 집안들끼리 연말연초에 서로 죽을 주고받으며 기교와 맛을 다투어, 견과류로 동물과 사람 모양을 만들어 죽 위에 올리기도 하였다.
섣달그믐은 묵은해와 새해가 교차하는 종교적 시간으로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아 제야를 보낸다. 이를테면 저장성 항주의 정자사(淨慈寺)는 서호(西湖)의 4대 고찰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불빛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 호수에서 정자사의 제야타종과 함께 새해 맞기를 꿈꾼다. 특히 해질녘 이곳의 동종이 울리면 산의 구석구석까지 종소리가 맑게 퍼져 남병산의 계곡과 새들이 화답한다 하여, ‘남병만종(南屛晩鍾)’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여 연야반(年夜飯)을 먹고, 자정과 함께 너도나도 밖으로 나가 폭죽을 터뜨려 거리는 기관총 소리 난무한 전쟁터처럼 요란해진다. 이 소리에 놀라 묵은해의 잡귀들이 모두 놀라 달아날 터이니,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최고조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춘절을 맞는다.

춘절은 신불과 함께
춘절 아침이면 집집마다 현관문 앞에 제단을 차려 향을 피우고 소지를 올리며 새해 발복을 기원한다. 이날 절식으로 북방에서는 교자를, 남방에서는 설떡을 먹는다. 교자(餃子)의 ‘교(餃)’는 교체할 ‘교(交)’와 음이 같아 신구가 바뀜을 뜻하고, 설떡인 연고(年)는 새해에 발전이 있다는 ‘연고(年高)’와 음이 같기에 새해음식으로 적합한 의미를 더한 셈이다.
춘절 무렵에 가장 바쁜 곳은 불교의 사찰과 도교의 도관으로, 새해의 복을 빌기 위해 찾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광동성 광주의 연화산(蓮花山)에 모신 금동관음상은 영험하기로 이름 높아 춘절에 많은 이들이 모여든다.
사람들은 거대한 관음상 앞에 향을 피우며 기도하고, 각종 소원을 적어서 둥글게 말아놓은 붉은 허원패를 소대에 태우며 그 내용이 신불께 닿기를 빈다. 몸통에 ‘풍조우순(風調雨順)’이라 쓴 범종을 울리고자 관음상 옆에 길게 줄을 섰다가, 마침내 힘찬 타종으로 만사 순조로울 새해의 길조를 종소리에 담아 띄운다.
그런가하면 정월 초닷새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의 생일이라 하여, 새해의 재운을 결정해줄 재신(財神)을 섬기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춘절 무렵 길에서 향을 사르고 지전(紙錢)을 태우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모두 재운을 비는 민속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찰을 찾아 ‘재신보살’로 좌정한 신불께 재복을 기원해야 더욱 영험하다고 여긴다. 몇 해 전 정월 초닷새 전야에, 호북성 무한의 귀원사(歸元寺)로 통하는 도로마다 향을 사르며 기도하는 이들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보도될 정도였다.
또한 재물신이 스님의 몸에 붙어 다닌다고 여겨, 스님과 마주치면 길을 터서 일행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물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두재신(兜財神)’이라 부른다. 모두 삼보가 지닌 위신력을 민간의 방식으로 해석한 데서 생겨난 풍습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복불교와 나란히, 신심 깊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새해를 열어가고자 춘절법회에 참석한다. 중국사찰에서는 청정하고 여법한 법회를 위해 동참신도들에게 3일간의 재계를 권하는 곳이 많다. 스스로 술과 담배, 고기와 오신채를 금하며 새해를 여는 법석(法席)에 자리하는 이라면 어떤 기복도 능가하는 가피가 내리지 않겠는가.

원소절의 연등과 묘회
‘백리 길마다 풍속이 다르다’는 중국이지만 대보름인 원소절(元宵節)의 풍경은 ‘하나의 중국’을 보는 듯하다. 원소절을 등절(燈節)이라 부르듯이 가는 곳마다 홍등을 걸고 갖가지 화려한 모양의 등을 밝혀, 거대한 중국대륙은 등불축제로 하나가 된다.
또 이날 아침이면 가정마다 찹쌀에 소를 넣은 하얀 새알심을 만들어 삶아 먹는다. 정월은 으뜸가는 달이라 원월(元月)이고 밤(夜)을 소(宵)라 하니 정월의 보름밤은 곧 ‘원소절’이요, 보름달 닮은 둥근 새알심도 ‘원소’라 부르며 이 날의 절식이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근래 원소절문화에서 빼놓은 수 없는 풍경이 있다. 단절되었던 전통문화가 정치적 방벽에서 벗어나면서 옛 묘회(廟會)의 풍습 또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본래 당나라 때 봄가을로 지신(地神)에게 제사 지내던 민간모임을 사회(社會)라 했는데, 점차 문화공연을 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불교와 결합하여 ‘묘회’라 불리게 된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장이 열리게 마련이라, 명절에 많은 이들이 사찰을 찾으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니 우리의 승시(僧市)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송나라 때는 전국의 유명한 묘회가 사찰ㆍ도관 등과 짝을 이루어 회자되었다. 북송의 상국사(相國寺) 묘회의 기록을 보면, 사찰로 들어서는 거리는 매우 번화하여 각종 상점이 즐비하고 별의별 물건이 모여들며, 곡예와 공연이 솜씨를 겨루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천 년 전에 이미 불공을 올리며 상거래와 오락을 겸하는 종합문화공간이 생겨나 민중의 사랑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196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졌다. 북경의 창전묘회(甸)는 불사(佛事)를 대표하는 종교공간이었고, 춘절에 창전묘회가 열리면 이름난 장인들이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몰려들어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창전묘회는 물론 큰 사찰과 공원 등에서 원소절을 중심으로 묘회가 복원되었으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연등과 전통 사찰민속의 조화가 예사롭지 않다. 사찰과 시장이 함께하여 성속(聖俗)을 아우르는 그들의 묘회가 중생들에게 종교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로 자리 잡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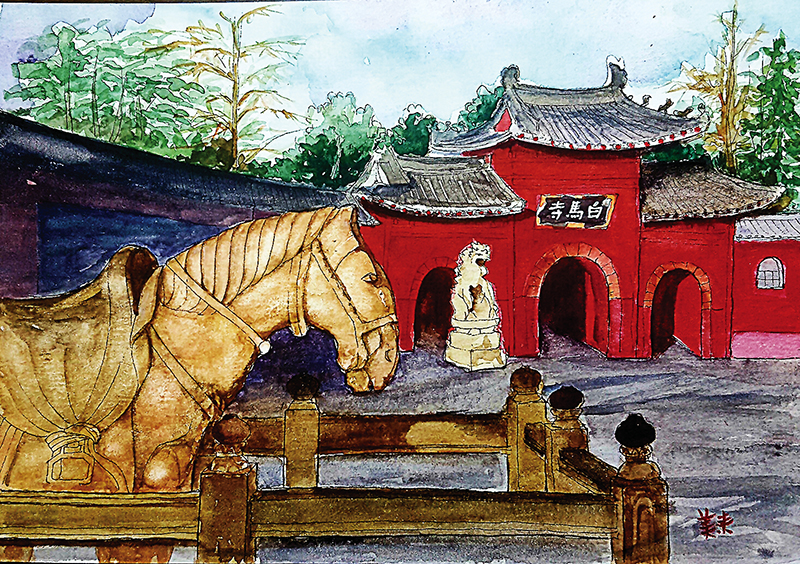
[불교신문3534호/2019년11월13일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