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정완영 선생을 애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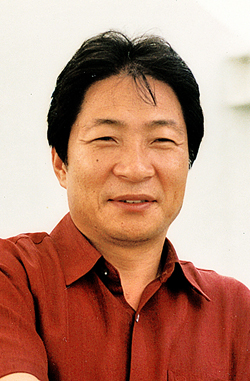
선생님의 발자취가 온누리에
가득 빛나기에 많은 후학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선생님, 백수 정완영 선생님
지금쯤 어디에 계십니까. 직지사 명적암에 올라 녹원스님과 담소라도 나누시는지요. 아니면 그토록 즐겨 가시던 찻집이었으니 <자명(紫明)>에서 메밀차를 드시며 자작시를 읊으시는지요. 선생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빗길까지 따라가 배웅을 하였음에도 도무지 선생님과 어디서 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녕 떠나신 것입니까. 이렇게 저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버려진 줄도 모르고 어제도 오늘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저만치 성큼 가을이 오는데, 선생님께서 그토록 꿈에 그리시던 황악산 단풍이 물들 준비를 다 마쳤는데 꿈을 깨듯 가던 길 돌아오십시오.
올해 따라 유난스레 날씨가 더웠기로 그 더위 하나 때문에 거처를 옮기기야 하셨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문하생들을 길러내셨음에도 뒷전으로 내버려둔 서운함이 그리도 크신 까닭이겠지요. 살벌하던 일경(日警)에게 맞서고 되찾은 나라를 어루만지며 지었던 ‘조국’인데 말입니다. 스무 권이 넘는 시조집이며 산문집, 그리고 시조 이론집에 쏟은 민족시 사랑이 얼만데 고작 더위 하나 못 이겼겠습니까. 이 땅의 아이들에게 쏟은 동시조 사랑은 또 어떻고요.
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오로지 생애를 송두리째 바쳐 선생님이 이루신 시조의 숲이 이제 울울창창 그 위용을 드러내려 하는데 가위질을 멈추시면 누가 있어 기둥을 키워내겠습니까.
선생님, 생각나십니까. 나라님이 민족시를 쓰고 관심을 보이는 나라라야만 문화선진국이라 하시며 청와대에다 편지를 쓰던 일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상심해 하시던 모습이라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망극하고 처연하던 지요. 하루도 시조를 생각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다시던 말씀이 새삼 가슴에 꽂힙니다. 정녕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민족시 사랑과 눈부신 결실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민족시의 황제’로 받들지 못한 저희의 불민함이 망극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선생님의 발자취가 온 누리에 가득 빛나기에 많은 후학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영원한 현역이시던 선생님, 선생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아무도 선생님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자유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바람의 희롱에도 끄떡없는 연꽃이 되셨고 고향 뒷산 늘 푸른 솔바람이 되셨습니다. 언젠가 함께 거닐며 바라보던 선유동 맑은 물소리가 되었고 ‘열무김치 서러운’ 고향하늘의 흰 구름이 되셨습니다. 비로소 어디에도 없으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절대자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교신문3232호/2016년9월10일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